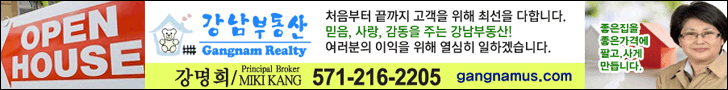질 바이든 박사, 대학서 강의 지속할 계획 21세기 퍼스트레이디의 모범상 보여줄 듯
“백악관에 들어가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지난해 8월 미국 CBS방송 인터뷰)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이 일하는 영부인이란 새 역사를 쓰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바이든 취임 후에도 대학 강단에 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영부인은 231년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질 바이든은 대선 기간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교사로서의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고 밝혀 왔다. 백악관도 공식 성명에서 영부인 대신 ‘질 바이든 박사’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영어 교사 출신으로, 바이든과 결혼 후에도 교육학 석·박사와 영문학 석사 학위를 따고 대학에서 30년 넘게 영어를 가르쳤다.
바이든이 2009년부터 8년간 부통령으로 일할 때도 일을 놓지 않았다. 미셸 오마바 전 영부인이 “질은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는 와중에도 항상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에 따라 질 바이든은 조만간 원래 교수로 있던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수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USA투데이는 이런 질 바이든을 ‘교수 영부인'(Professor FLOTUS, first lady of the US)이라고 표현했고, WP는 ‘바이든 박사'(Dr. B)로 지칭했다.

질 바이든은 자신의 본업을 이어가면서 퍼스트레이디로서 역할도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남편의 대선을 도우면서 직장을 잠시 중단하고 선거 운동에 힘썼다. 예비 선거에서는 적극적으로 유권자들과 어울리며 연락처를 교환했고, 부통령 후보 선정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민주당 중진 4명 중 최종적으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선정됐다고 전화로 알린 것도 질 바이든이었다.
하지만 대내외 활동이 많은 데다 바이든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해온 그가 본업과 퍼스트레이디직을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경호 문제도 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SS)으로부터 경호를 받아야 하는데, 교수직을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몇 번씩 18.3마일(약 29.5㎞)의 거리를 출퇴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USA투데이는 질 바이든이 세컨드레이디 시절 비밀경호국 요원들에게 대학생처럼 옷을 입고 복도나 강의실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있어달라고 부탁했던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장이었던 지미 맥클랠런은 “바이든은 남들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 늘 조심했다”며 “그는 퍼스트레이디이기 이전에 좋은 교육자”라고 평가했다.
오하이오대 캐서린 젤리슨 역사학 교수는 “질 바이든은 21세기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것”이라며 “대통령의 부인이 퍼스트레이디이자 직업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희 기자 angela0204@news1.kr (기사제공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