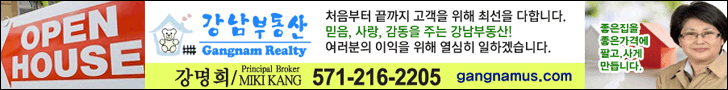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강박증’에 빠진 듯하다. 차기 대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밀어붙이면서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미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6·25전쟁 종선선언’ 추진을 비롯해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그 후 석 달 간 ‘종전선언’은 우리 외교의 최대화두가 됐고,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앞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선언 뒤에도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주한미군·한미동맹에 관한 사안은 별개란 얘기였다.
그러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방미 때 종전선언을 두고 “누구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종전선언에 정치적·상징적 의미 이상의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 또한 제기돼온 상황이다.
물론 한미가 논의해왔다는 종전선언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데다, 북한의 호응 여부 또한 남아 있어 그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 그러나 현 정부가 문 대통령 임기 중 ‘유산 만들기’에 지나치게 집착하다보면 다음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 같은 우려는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나 국회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처리, 심지어 최근 해군참모총장 인선을 두고도 제기됐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었으나, 관련 평가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계속 지연된 탓에 공약 달성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전작권 전환’ 논의의 주체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중(내년 3월) 전작권 전환 관련 평가를 재개하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미국 측은 이미 2차례나 평가 재개 시점을 내년 후반기로 못 박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 중 경항모 사업 예산의 경우 지난달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선 여야 합의로 삭감했었으나, 여당(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야당과의 합의를 뒤집고 전액 복원시켰다. 정부 예산안의 단독처리란 무리수까지 두면서 말이다. 이 과정에선 청와대도 움직였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3만톤급 경항모가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던들, 여당이 72억원이 채 못 되는 경항모 사업 예산 때문에 야당과의 합의를 깼을까 싶다.
여당은 앞서 경항모 예산을 정부안대로 되돌리면서도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무려 6400여억원을 깎은 다른 무기체계 개발·도입 관련 예산은 그대로 뒀다. 당장 문 대통령 임기 말 ‘예산 알박기’를 통해 경항모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차기 정부에 숙제를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주엔 군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정임기가 4개월가량 남아 있던 부석종 해군참모총장도 교체했다. 내년 3월 대선과 5월 새 정부 출범 사이 부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조기’에 교체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군 인사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이번 해군참모총장 인사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은 사실상 제한됐다. 새 정부 출범 후 중도에 교체하지 않는 한 약 1년 반의 잔여 법정임기를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비슷한 형편이다.
우리 정부가 CPTPP에 가입하려면 일본을 비롯한 11개 회원국 모두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데는 한일 양국 모두로부터 이견이 없다. 이는 한일관계 개선이 차기 정부의 숙제란 뜻이기도 하다. 거기에 현 정부가 CPTPP 가입까지 더해줬다.
퇴임이 예정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잔여임기 5개월은 상당히 긴 시간이다. 끝까지 현안을 챙기면서 정권의 구심력을 유지해가겠다는 의도 역시 그 자체만 봤을 땐 사실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여만 놓고 떠난다면 그에 따른 ‘후과'(後果)는 다음 대통령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이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