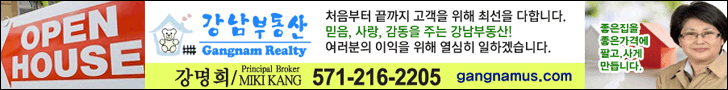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의 정치·행정 수도이다. 워싱턴 지역 동포사회 또한 이런 프레임에 벗어날 수 없어 한국 정치와 민감하게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방미에 얽힌 일화를 중심으로 한미 간 풍습과 제도적 차이점을 매주 월,화 【리국 칼럼】으로 전해드린다. 필명인 리국 선생님은 재미 언론인으로 오랜기간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기자이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자취를 하는 이유

# 새내기 의원들의 고민
2019년 새해 벽두, 제116대 연방 의회가 개원하자 새내기 의원들은 워싱턴 입성에 꿈에 부풀었지만 그게 신기루인 걸 깨달은 건 얼마 되지 않았다.
미네소타에서 하원에 처음 진출한 피트 스타우버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경찰 출신인 그는 공화당 소속으로 전해 11월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현역을 꺾으며 기염을 토했다.
개회 전에 의원실을 추첨으로 배정 받은 그는 의정활동 기간에 묵을 집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그의 가족은 미네소타 지역구에 있다. 의사당 인근에 방을 알아보니 원룸 하나에도 2,200달러를 오르내렸다. 한 달에 250만원이나 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그는 동료 의원 3명과 작은 아파트 하나를 빌려서 나눠 쓰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처럼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의원 3명이 공동으로 자취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워싱턴의 현실이다.
갖가지 튀는 행동으로 주목 받은 신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11월 선거에서 29세의 나이로 최연소 하원의원에 당선된 그녀도 워싱턴에서의 숙식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의사당 인근의 원룸 아파트를 빌린 그녀는 첫 달 렌트비부터 내지 못했다.
“1월에 첫 월급을 받으면 밀린 렌트비부터 갚을 생각입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당선 되자마자 겪은 절박한 처지를 그렇게 설명했다.

워싱턴 근교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타운 홈 형태. 워싱턴DC에서 방 하나짜리를 렌트하려면 한달에 3천불 이상이 든다.

# 워싱턴의 렌트비
연방 하원의원의 연봉은 17만4천 달러다. 적지 않은 액수인데 왜 방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될까. 그것은 첫째 워싱턴 DC의 렌트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의사당 인근에서 원룸 하나를 빌리려면 최소 2천 달러에서 2천500달러를 매달 내야 한다. 원 베드룸이라면 더 비싸다. 적어도 매달 3천500달러를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가족이 사는 집이 있다. 그 자신도 지역구와 의정생활을 하는 워싱턴을 오가며 살아야 한다.
한국은 지역구가 차로 몇 시간 가면 되지만 미국은 비행기로 몇 시간씩 다녀야 한다. 그러니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부자가 아니라면 지역구에 있는 집은 모기지(Mortgage: 주택담보 융자) 납부가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주택 융자금을 매달 몇 천 달러씩 갚아야 한다. 물론 가족의 생활비도 보태야 한다. 거의 매주 워싱턴과 지역구를 오가는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다.
연봉도 세금 떼고 나면 월 1만 달러 조금 넘게 수중에 들어온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구조다. 사정이 이러니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지 않은 월급쟁이 출신 의원들은 워싱턴에서 공동 자취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의회 인근의 부속건물들.
# 의원회관에서 숙식 해결도
심지어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의원족도 있다.
“회기 중에는 의사당의 사무실에 접이식 간이침대를 갖다놓고 생활해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몇 년 전 크리스티 노엠이란 하원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고백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연방 의회에는 하원 435명과 상원 100명 등 535명의 의원이 있다. 이들 중에서 매 회기마다 평균 100명의 안팎이 의원실에서 잠자리를 해결한다. 간이침대를 갖다놓거나 소파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다. 의원들의 연봉으로 주거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하원의장이 재량으로 의원회관에서의 숙박을 눈 감아 주면 괜찮은데 때로 빡빡한 의장이 취임하면 이마저도 금지시켜 곤혹한 처지가 된다.
의회에서 의욕적으로 일해 보려고 하는 의원들이 등원하자마자 주거문제 때문에 기가 꺾이는 것이다.

의원 회관의 내부 모습.

# 주택수당이라도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액 연봉을 받는 ‘가난한 의원’들은 내심 주택 수당 지급을 희망하고 있다. 2017년 하원 정부개혁감독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제이슨 차페츠(유타) 의원은 미 의회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주택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직설적으로 주장했다.
“의원들이 1년에 3만 달러의 주택 수당을 받는다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
또 하나 의원들이 기대는 것은 세비 인상. 현재의 연봉은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에 자진 동결을 택한 후에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소수당이던 공화당 주도로 세비 동결을 한 것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래 연방의원들의 연봉(Salaries of Members of Congress)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2~3%씩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10년째 세비가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세비 인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격이 돼버렸다.

의회 내부에 있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동상과 벽화.
# 의원들의 평균재산은 116만불
물론 전체 의원들이 가난한 건 아니다. 오히려 미국 국민들의 평균 보다 5배 이상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개원한 제115차 의회의 535명의 상하원의원들의 평균 순 자산은 116만 달러였다. 약 13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인 평균 순자산인 21만 달러와 비교하면 의원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의원들의 궁핍한 워싱턴 생활에 ‘정치적인 쇼’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부자 나라에도 가난한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내 배 부르니 종의 밥 짓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부자 의원들이 가난한 국민들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돈이 없어 자취생활을 하고,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의원들이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 Number | Title | Date |
| 52 |
워싱턴에서 살려면 한 달에 얼마나 들까?
|
2021.09.20 |
| 51 |
미국 선거, 후원금 얼마나 낼 수 있나?
|
2021.09.20 |
| 50 |
미국 정치인들의 뇌물과 부정부패
|
2021.09.12 |
| 49 |
특권의식을 버려라!: 미국 고위층들의 권위주의
|
2021.07.09 |
| 48 |
미국 국회의원들이 자취를 하는 이유
|
2021.07.09 |
| 47 |
미 정계에서 신인 돌풍은 왜 어려운 걸까?
|
2021.07.09 |
| 46 |
“동포들이 자긍심 갖는 조국 만들겠다”: 문재인의 약속
|
2021.06.24 |
| 45 |
연예인 저리 가라: 문재인 동포간담회 이모저모
|
2021.06.24 |
| 44 |
파격, 아이돌 스타급 환영: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방문 이모저모
|
2021.06.24 |
| 43 |
"건배사는 동대문으로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일화
|
2021.06.22 |